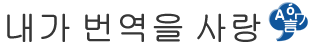- 텍스트
- 역사
Mannheim betont die »Standortgebund
Mannheim betont die »Standortgebundenheit des Denkens«:
alles Denken ist in einem sozialen Raum verankert, und diese Verankerung ist konstitutiv für das Denken. Gedanken und Wissensinhalte treten nicht isoliert auf. Hinter ihnen steckt immer ein kollektiver Erfahrungszusammenhang.
Das bezieht sich nicht nur auf alltägliches, sondern auch auf historisches, politisches,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Denken. (lediglich naturwissenschaftliches Denken ist ausgenommen.) Denken folgt also nicht nur den Gesetzen der Logik, sondern auch der »Sozio-Logik«. (Knoblauch)
alles Denken ist in einem sozialen Raum verankert, und diese Verankerung ist konstitutiv für das Denken. Gedanken und Wissensinhalte treten nicht isoliert auf. Hinter ihnen steckt immer ein kollektiver Erfahrungszusammenhang.
Das bezieht sich nicht nur auf alltägliches, sondern auch auf historisches, politisches, geistes- und sozialwissenschaftliches Denken. (lediglich naturwissenschaftliches Denken ist ausgenommen.) Denken folgt also nicht nur den Gesetzen der Logik, sondern auch der »Sozio-Logik«. (Knoblauch)
0/5000
만 하 임, 강조는» 생각의 사이트:모든 생각은 사회적 공간에 뿌리 그리고이 앵커리지는 사고에 대 한 제정. 생각과 지식을 발생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들 뒤에 집단적 경험 연결이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말합니다 매일, 하지만 인문학도 생각 하는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 (과학적 사고만 제외 됩니다.) 사고 다음, 논리의 법률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는» 사회 논리 «.» (마늘)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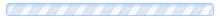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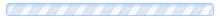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 만하임은 "사고의 '위치의 제약을 강조하는
모든 사고는 사회적 공간에 고정되고,이 고정 사고의 구성 적이다. 생각과 지식의 내용이 분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항상 집단적인 경험의 맥락이다.
이 일상에,뿐만 아니라 인문, 역사, 정치적, 사회 학적 사고에없는에만 적용됩니다. (순수하게 과학적 사고는 예외입니다.) 그래서뿐만 아니라 논리의 법칙을 따른다,뿐만 아니라 "사회 논리"의 생각. (마늘)
모든 사고는 사회적 공간에 고정되고,이 고정 사고의 구성 적이다. 생각과 지식의 내용이 분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 항상 집단적인 경험의 맥락이다.
이 일상에,뿐만 아니라 인문, 역사, 정치적, 사회 학적 사고에없는에만 적용됩니다. (순수하게 과학적 사고는 예외입니다.) 그래서뿐만 아니라 논리의 법칙을 따른다,뿐만 아니라 "사회 논리"의 생각. (마늘)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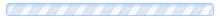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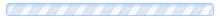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曼海姆 지적한: » standortgebundenheit denkens « 생각하는 모든 사회 공간 은 한 닻 닻 이 이번 구상.사상과 지식을 다른 일이 아니다.그들은 항상 erfahrungszusammenhang 뒤에서 한 집단.이 아니라 관련 일상 생활, 또한 역사에 대한 정치인문 및 사회 과학.단지 과학의 사고, 사고 제외). 그래서 아니라 논리 법칙을 따르다, 그래도 logik « 한 ► "사회.(마늘)
번역되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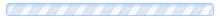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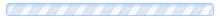
다른 언어
번역 도구 지원: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어, 리투아니아어, 마라티어, 마오리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어, 몰타어, 몽골어, 몽어, 미얀마어 (버마어), 바스크어, 베트남어, 벨라루스어, 벵골어,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아노, 세소토어, 소말리아어, 쇼나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디어, 신할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 크리올어, 아일랜드어, 아제르바이잔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언어 감지,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어, 영어, 오리야어, 요루바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웨일즈어, 위구르어, 이그보어, 이디시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자바어, 조지아어, 줄루어, 중국어, 중국어 번체, 체와어,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클링곤어, 키냐르완다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지크어, 타타르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투르크멘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어,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언어 번역.